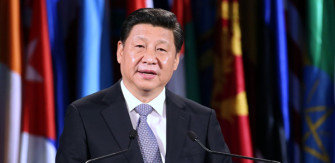A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8년차 검사다. 검찰에서 잘나가는 편은 아니다. 하지만 그의 수사는 최근 5년 새 여러 번 우수사례로 뽑혔다. 검찰총장에게서 매번 50만∼100만 원씩 격려금도 받았다. 소속 검사장에게서 10만∼30만 원의 격려금을 받은 수사는 훨씬 많다. 평검사 평균의 2배 정도 좋은 실적이다.
술·밥 사야 열정 끌어내
성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. 수사관과 여직원의 열정을 끌어내야만 가능하다. 검사실마다 3∼5명인 수사관 및 여직원과 식사하는 데 드는 돈만도 매달 100만 원 안팎이다. A는 방식구들과 점심은 매주 1번, 저녁 회식은 매달 2번 정도 한다. 볼펜 등 검사실의 사무용품 비용도 매달 10만∼15만 원이 나간다. 직원에게 피의자를 잡아오라고 할 때는 최소 10만 원의 여비는 쥐여 보내야 한다. 하지만 검사실에 지급되는 것은 20만∼25만 원 한도의 그린카드가 전부다. 나머지는 모두 검사 개인 부담이다.
부장검사가 되면 이런 부담이 커진다. 부장에게는 매달 150만 원 안팎의 수사활동비가 따로 지급된다. 하지만 30∼40명이나 되는 부서 직원의 1회 회식비만도 100만 원 안팎이다. 쇠고기는 엄두도 못 낸다. 부하 검사가 수사 한 건 해오면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다. 짧게는 3, 4일, 길게는 열흘 이상 밤늦게 또는 밤을 새우며 수사한 걸 뻔히 아는 부장이 회식도 안 시켜주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.
과거엔 변호사나 지인에게서 받는 전별금이나 휴가비로 모자라는 수사비를 충당했다. 친구나 고향 선배를 스폰서로 둔 검사도 있었다.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불러내 부서 회식을 시켜주기도 했다. 지방에서 올라올 땐 스폰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풍습도 있었다.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. 특히 2010년 부산의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사 스폰서는 씨가 마를 정도가 됐다.
최근 검찰의 ‘돈 봉투 파문’은 시기와 장소만 부적절한 게 아니다. 술자리에서 쌈짓돈처럼 준 것만 문제가 아니다. 더 큰 문제는 연간 280억 원 안팎인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간부의 평판 유지 및 계보 형성비로 변질됐다는 점이다.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주고 인사 때 끌고 밀어주니 ‘우병우 라인’처럼 계보가 생긴다.
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뿌린 돈 역시 마찬가지다. 일각에서는 전관예우까지 내다본 ‘돈 뿌리기’라는 분석도 나온다. 수사할 때 자신의 지휘 의견에 군말 없이 따라준 데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. 양심을 믿고 용처도 묻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정치검사를 기르는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.
특수활동비는 ‘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’에 쓰라고 국민 혈세로 검찰에 준 돈이다. 후배에게 용돈처럼 줘 계보 만들라고 준 돈이 아니다. 특수활동비는 설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.
라인 형성… 정치검찰 젖줄
수사하는 데 쓴 돈을 100% 지급하지 않는 검찰 관행도 함께 고쳐야 한다. 수사비로 들어간 돈은 모두 보전돼야 한다. 스폰서가 있던 과거처럼 ‘검사가 10만 원 여비 준 것까지 일일이 청구하느냐’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. 매달 100여만 원씩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수사를 해도 이를 보전할 길이 없다면 큰 문제다.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쓰듯 멋대로 쓰는 것도 적폐지만 검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사하는 관행도 적폐다.
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@donga.com
술·밥 사야 열정 끌어내
성과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. 수사관과 여직원의 열정을 끌어내야만 가능하다. 검사실마다 3∼5명인 수사관 및 여직원과 식사하는 데 드는 돈만도 매달 100만 원 안팎이다. A는 방식구들과 점심은 매주 1번, 저녁 회식은 매달 2번 정도 한다. 볼펜 등 검사실의 사무용품 비용도 매달 10만∼15만 원이 나간다. 직원에게 피의자를 잡아오라고 할 때는 최소 10만 원의 여비는 쥐여 보내야 한다. 하지만 검사실에 지급되는 것은 20만∼25만 원 한도의 그린카드가 전부다. 나머지는 모두 검사 개인 부담이다.
부장검사가 되면 이런 부담이 커진다. 부장에게는 매달 150만 원 안팎의 수사활동비가 따로 지급된다. 하지만 30∼40명이나 되는 부서 직원의 1회 회식비만도 100만 원 안팎이다. 쇠고기는 엄두도 못 낸다. 부하 검사가 수사 한 건 해오면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다. 짧게는 3, 4일, 길게는 열흘 이상 밤늦게 또는 밤을 새우며 수사한 걸 뻔히 아는 부장이 회식도 안 시켜주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.
과거엔 변호사나 지인에게서 받는 전별금이나 휴가비로 모자라는 수사비를 충당했다. 친구나 고향 선배를 스폰서로 둔 검사도 있었다. 부장검사가 스폰서를 불러내 부서 회식을 시켜주기도 했다. 지방에서 올라올 땐 스폰서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풍습도 있었다.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. 특히 2010년 부산의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사 스폰서는 씨가 마를 정도가 됐다.
최근 검찰의 ‘돈 봉투 파문’은 시기와 장소만 부적절한 게 아니다. 술자리에서 쌈짓돈처럼 준 것만 문제가 아니다. 더 큰 문제는 연간 280억 원 안팎인 특수활동비가 일부 고위 간부의 평판 유지 및 계보 형성비로 변질됐다는 점이다.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주고 인사 때 끌고 밀어주니 ‘우병우 라인’처럼 계보가 생긴다.
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뿌린 돈 역시 마찬가지다. 일각에서는 전관예우까지 내다본 ‘돈 뿌리기’라는 분석도 나온다. 수사할 때 자신의 지휘 의견에 군말 없이 따라준 데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. 양심을 믿고 용처도 묻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정치검사를 기르는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.
특수활동비는 ‘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’에 쓰라고 국민 혈세로 검찰에 준 돈이다. 후배에게 용돈처럼 줘 계보 만들라고 준 돈이 아니다. 특수활동비는 설치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.
라인 형성… 정치검찰 젖줄
수사하는 데 쓴 돈을 100% 지급하지 않는 검찰 관행도 함께 고쳐야 한다. 수사비로 들어간 돈은 모두 보전돼야 한다. 스폰서가 있던 과거처럼 ‘검사가 10만 원 여비 준 것까지 일일이 청구하느냐’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. 매달 100여만 원씩 자신의 돈을 들여가며 수사를 해도 이를 보전할 길이 없다면 큰 문제다.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쓰듯 멋대로 쓰는 것도 적폐지만 검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수사하는 관행도 적폐다.
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@donga.com